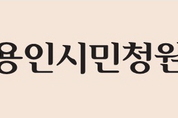가을색 머금은 여강을 품다 ‧ 걷다 ‧ 느끼다
여주 고달사터와 영릉의 소나무 숲 사이에 빛이 내렸다.
살아 백년의 저택이 아무리 호화로운들 죽어 만년 유택만 못한다고 했던가. 지금의 서울 내곡동 대모산에서 옮겨 온 여주 영릉(英陵)은 ‘해와 달의 모습을 띠면서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형세’인 최고의 명당이다. 하지만 객(客)은 풍수와 지리에 과문(寡聞)한 때문인지 제멋대로 자란 소나무의 푸름이 먼저 보였다.
영릉은 4개의 돌로 받친 혼유석 2개를 놓은 합장릉이다. 살아서도 금슬 좋았던 세종과 소헌왕후가 혼유석에 나앉아 부족한 우리들을 지켜볼 것만 같다.
“우리글을 만드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인데 뭐가 나쁘단 말인가”라며, 사대주의 학자들을 물리치던 세종의 단호함을 지키는 석상들은 듬직했다.
명성황후의 생가는 말끔하게 빛났다. 1873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을 움직였던 중전민씨가 8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만감(萬感)이 교차된다. 그가 남긴 역사의 상흔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낭인들의 날선 검에 쓰러진 중전민씨는 비극이지만 역사속의 그녀는 비애(悲哀)일 뿐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 물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옹을 흉내 낼 수 없어도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진 신륵사. 벽절이라 부르는 신륵사는 그림 같은 풍광을 뽐냈다. 강월헌 아래로 여강이라 불리는 남한강은 유유(幽幽)하다. 지금은 사라진 은모래 백사장의 눈부심이 강렬했던 그 옛날에도 가을빛은 흘렀으리라. 우리나라 왠만한 절들은 원효와 의상, 도선이 만든 절이다. 신륵사도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고려 우왕 때인 1376년 나옹선사의 뚜렷한 입적으로 소문을 탔다. 세종의 깊었던 불심을 헤아렸는지 영릉의 원찰(願刹)로 정했으니 왜란시 조직된 500여 승군(僧軍)은 충군애국의 자발적 의병인 셈이다. 임진왜란의 화마(火魔)를 입었던 절은 남한강을 오르내리던 경강상인들의 시주를 받아 유명해졌다.
강변에 우뚝 선 다층전탑은 신라의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 유일한 전탑이다. 예배의 대상인 탑이 금당의 본존불에서 멀리 떨어진 이유가 단순히 풍수지리설 때문 이었을까. 우뚝 솟은 전탑을 보고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북적였을 17~18세기의 신륵사는 망치소리도 요란했을 것이다.
다포식 팔작지붕의 정면1칸 건물 조사당은 단아함과 집중력이 돋보인다. 나옹화상과 그의 스승인 지공, 무학대사의 영정이 안치된 그림 같은 조사당은 신륵사의 매력이다. 극락보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대리석으로 다듬어진 다층석탑이 눈부셨다. 탑의 면면(面面)에 묘사된 파도 문양, 용과 구름모양은 부드러운 질감으로 눈을 호강시켰다.
성긴 숲을 품고, 삼면이 야트막한 작은 언덕 사이에 천년동안 시간이 멈춘 옛 절터가 있다. 한때 사방30리가 모두 절땅이었고 수십리까지 퍼진 향화(香火)가 퍼졌던 고달사였지만 이제는 찾는이 없어 호젓했다.
이미 깨져버린 체감률과 긴장의 균형미는 사라졌지만 절대적 강건함은 장엄했다. 나른한 시간을 헤치고 살아남은 돌들은 호방했던 10세기 전 고려의 기상을 보여준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764)때 창건 기록이 있으나 절터에선 8세기 기왓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려 태조부터 광종시기의 약 50여 년간, 원종국사가 고달사에 머물면서 화려했던 사찰이 언제 어떻게 폐사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짧고도 강렬한 영화(榮華)였다. 위풍당당했던 시절, 선문(禪門)의 기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빼어난 석불대좌로 남아있다. 불상은 사라졌지만 장중한 대좌는 여전히 빈 터의 금당을 지키고 있다.
‘폐허는 폐허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고달사터에 상상 그 이상의 귀부(龜趺)가 있다. 동원할 수 있는 손재주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태산 같은 힘의 분출, 치켜 올라간 험상궂은 눈꼬리, 콧등에 주릅 잡힐 정도로 벌름거리는 코, 뿜어져 나오는 눈빛, 움켜쥔 발과 비집고 나온 발톱의 기상은 전설로 남은 석공 ‘고달’의 혼(魂)일 것이다.
고달사터에는 두 개의 부도가 있다. 반듯한 모범생의 가방처럼 원형 그대로 유지된 보물7호인 원종대사 부도와 장중하고 완벽한 국보4호 고달사터 부도이다. 고달사터 부도는 신라시대 8각원당형의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초기의 부도이며 남아있는 부도 가운데 가장 크다. 부도의 지붕돌 처마 밑으로 가을빛이 쏟아진다. 천의(天衣) 자락 휘날리는 비천(飛天)들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날렵하다. 덩달아서, 쪽빛으로 물든 하늘로 솟구치고 싶은, 가을은 저물 듯 하다.
 영릉은 넓고도 호방한 기운을 보여준다
영릉은 넓고도 호방한 기운을 보여준다
 고달사지 승탑의 장중하고 미려한 조각은 황홀하다
고달사지 승탑의 장중하고 미려한 조각은 황홀하다

신륵사 다층 전탑은 남한강의 등대역할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천년 폐사지 고달사터는 호젓하다
천년 폐사지 고달사터는 호젓하다
 벽절이라 불리는 신륵사의 대웅보전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석탑
벽절이라 불리는 신륵사의 대웅보전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석탑
오룡(오룡 인문학 연구소 소장)<용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