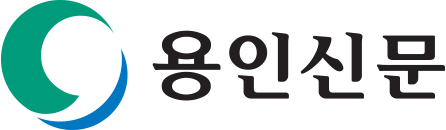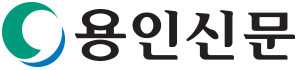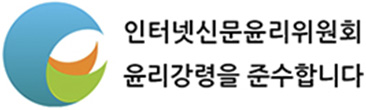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
||
처음으로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을 때 야릇했던 감정을 잊을 수 없다. 첫 주말에 혼자서 숙소에 고립되어 향수에 젖어 우울했던 기억도 지울 수 없다.
몇 달 지나 언어가 소통되면서 지도와 카메라를 들고 길을 찾아 나섰고, 그제서야 겨우 할 일을 찾았던 것이다.
다행이랄까? 내가 머물던 숙소가 야마노베노가이칸(山邊會館)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 있는 곳이다. 그 길은 바로 아스카지역과 나라현을 잇는 도로였다.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하던 한반도의 선조들이 왕래하였던 길이다.
일본 고대문화의 발상지를 옆에 두고 1년을 살았던 것이 천행이 아닐 수 없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작정 걸었던 길 옆에 아스카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궁지(宮趾)가 있었다. 여름 날 더위를 피해 쉬었던 곳이 이소노가미신궁(石上神宮)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엔 칠지도(七支刀)가 보관되어 있었다.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얼마나 먼지도 모른 채 반 나절이나 자전거를 타고 갔던 도다이지(東大寺)를 열 번 이상 다녀왔다.
그 덕에 가라쿠니신사(辛國社)가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알게 되객? 가라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분개했던 일도 기억에 뚜렷하다.
사천왕사에서 1400년간 계승되는 사자춤을 직접 보면서 벅찬 가슴을 누를 수 없었다. 물론, 일본의 문화환경 속에서 적지 않게 변형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처음 사자춤을 보는 순간, ‘우리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일본인들이 고구려의 사자춤을 이제껏 공연해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만의 공연예술도 적지 않는데 말이다. 한국에서는 사라져 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주장할 것이다. 사자춤의 기원은 일본 오사카사라고…
그 이후부터 일본역사서에서 우리 문화유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실재하는 문화유산은 역사기록이 부재한 현실에서는 확실한 증거물이다. 그것이 일본에 실존해 있는 한, 이제껏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던 것이 언젠가는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광개토왕비문, 칠지도의 명문 등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견해차를 단순히 학설적인 차이로만 인식하고 안주한다면, 그건 큰 문제이다. 고구려의 존재를 부정하는 중국의 태도나, 가야를 일본의 임나본부로 주장하는 일본?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교토에 있는 미미쯔카(耳塚)는 이제 한국인들의 필수 관광지가 되었다. 10여년 전엔 옆에 사는 일본 사람들조차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공원에 있는 납골당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겼었다.
삼중스님의 노력으로 차츰 한국인들에게 전해졌고, 한국인들이 쿄토 관광차 와서는 참배하고, 일본인 관리자가 나서서 해설도 해주는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
마찬가지로 시인 윤동주가 다니던 도시샤(同志社) 대학에는 윤동주시비가 세워졌다. 해마다 한국인들이 찾아와 헌화하다보니, 한국인들이 방문하면 정문 수위도 알아차리고 안내를 해준다. 윤동주 시비가 있는 곳은 자연스레 한국 유학생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그곳에 가면 서울의 대학로 어느 쉼터에 와 있는 느낌을 갖게 된다.
비록 일본에 있다 해도, 우리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 알아주고 아끼면 소실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행지마다 우리가 제작한 안내서를 배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일본 현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돌아다 본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니다. 더욱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딸아이와 함께 답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천행이다.
혹시나 일본의 관서지방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작은 글이지만 그동안 연재한 글을 한번 쯤 다시 읽고 현장에서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 그동안 ‘일본속의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서’ 연재를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위의 삶의 문화를 보다 깊이 다루는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