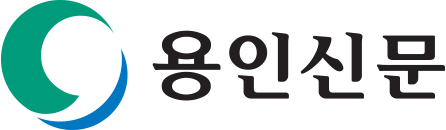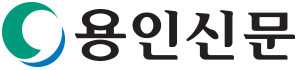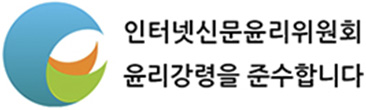종합논술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모들은 당황하게 된다. 글만 쓰면 되는 논술이 아니라 어린이가 그 글을 작성하게 되는 중간과정, 즉 어린이 사고 부분이 논술문 속에 녹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편파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물을 관찰하게 되면, 종합적인 사고와 멀어지게 된다. 사물을 보더라도 공처럼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같은 형태를 가진 물건은 상당히 드물다.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틀리다. 사물화를 그리면서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어린이의 그림 속의 형태가 달라지듯이, 어느 입장에서 생각하는가에 따라 하나의 사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틀려 질 수 밖에 없다.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의견과 조율하는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사고의 습관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자신의 관념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상을 그자체로 관찰하는 습관은 어린이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요즘 서점에 들려보면 어린이의 시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책들이 많이 보인다. 직접적인 경험이 어렵다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이에게 책을 읽고 자신과 다른 점들을 찾게 하자. 제3세계 어린이들의 삶의 모습과 자신의 사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 가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어린이의 생각이 달라진다.
종합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대성이란 ‘나’이외의 다른 대상을 정당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자신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일은 정신의 평형성을 요구 된다. 한가지로 편중되지 않은 독서훈련을 통해 어린이 사고의 폭을 다각화하면 ‘나’ 중심의 주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술적 사고, 종합적 사고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