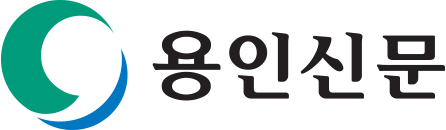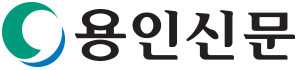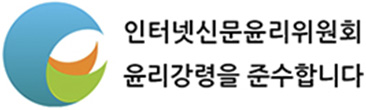용인신문 |  사이버스페이스 시대,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일상 곳곳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는다. 휴대폰 하나로 은행 업무와 쇼핑, 학습과 소통까지 해결되는 오늘날, ‘편리함’은 더 이상 희소한 가치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디지털 문명의 최전선에서 ‘낡은 것의 귀환’이라 불리는 뉴트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시대,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일상 곳곳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는다. 휴대폰 하나로 은행 업무와 쇼핑, 학습과 소통까지 해결되는 오늘날, ‘편리함’은 더 이상 희소한 가치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디지털 문명의 최전선에서 ‘낡은 것의 귀환’이라 불리는 뉴트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뉴트로(Newtro)는 단순한 복고(Retro)와는 다르다. 복고가 과거의 양식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뉴트로는 옛것을 현재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변용한다. 예컨대 카세트테이프 모양의 블루투스 스피커, 도트 그래픽을 차용한 최신 모바일 게임,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영감을 받은 필터 앱은 모두 뉴트로의 산물이다. 과거를 경험한 세대에게는 추억의 매개체가 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이국적인 ‘새로움’으로 다가간다.
뉴트로 열풍은 무엇보다 인간의 감각적 갈망을 드러낸다. 디지털 기술은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그만큼 차갑고 무균질적인 느낌을 준다. 반면 아날로그적 경험은 불완전하고 느리지만, 그 속에 따뜻함과 서사가 깃들어 있다. LP 음반을 다시 듣는 이유는 단순히 음질 때문만이 아니라, 바늘을 올리고 내리는 행위 자체가 주는 몰입과 의식의 감각 때문이다. 이는 기술이 아무리 진보하더라도 인간의 감각적·정서적 필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뉴트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다.
또한 뉴트로는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한다. 80~90년대 감성은 부모 세대에게는 향수이고, MZ세대와 알파세대에게는 신선한 문화다. 부모가 즐기던 콘솔 게임기를 자녀가 에뮬레이터로 체험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90년대 패션을 재해석한 의상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대 간 공감의 장을 만든다. 이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에 더욱 힘을 얻는다. 과거는 개인의 기억을 넘어 공유 가능한 문화적 자원이 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뉴트로는 또한 문화산업의 전략적 기획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안정된 이미지에 위안을 구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심리를 간파해 뉴트로적 요소를 상품 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실제로 레트로 디자인이 적용된 전자제품, 복고풍 그래픽을 활용한 게임, 90년대 감성을 담은 드라마와 음악 콘텐츠는 높은 소비력을 발휘한다. 이는 뉴트로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차원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코드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뉴트로를 단순히 ‘향수 소비’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 속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 탐구가 숨어 있다. 첨단 기술이 매일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과거라는 익숙함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 한다. 뉴트로는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며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다시 묻는 행위다. 그래서 뉴트로는 ‘회귀’가 아니라 ‘순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재탄생하는 것이다.
뉴트로 열풍은 결국 디지털 문명 속 인간다움의 회복을 의미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무한한 확장과 속도의 세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느림과 감성, 따뜻한 접촉을 갈망한다. 기술은 편리함을 보장하지만, 인간은 이야기와 추억, 감각의 흔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 뉴트로는 바로 이 인간적 필요가 낳은 문화적 징후다.
오늘날 뉴트로 콘텐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기술의 시대에, 인간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 답은 ‘빠름과 느림의 조화’, ‘새로움과 익숙함의 균형’ 속에 있을 것이다. 뉴트로의 귀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 일깨우는 문화적 나침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