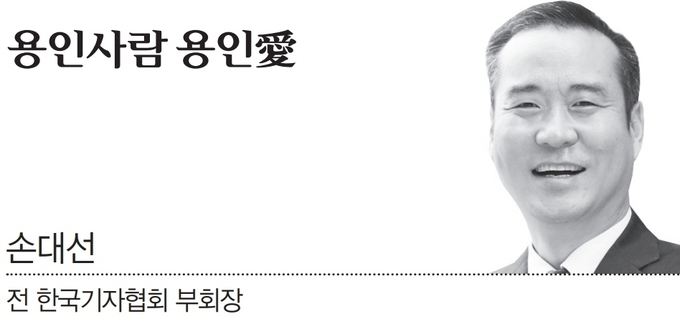
[용인신문] 딸아이는 유치원 입학이 지연된 탓에 3월 한달 동안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한동안 홀로 놀던 딸아이에게 뜻밖의 친구들이 생겼다. 아파트 건너편 갈곡초등학교 3~4학년들이었다.
나는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없다”며 “우리 딸도 끼워주라”고 부탁했다. 딸아이 미래의 학교 선배들에게.
장장 2시간 동안 미래의 후배와 놀아준 너그러운 어린이들. 6~7명이 놀이터 전체를 무대로 술래잡기를 하다 딸아이가 지겨워하면 2개 조로 나눠 시소, 그네 타기를 반복했다.
다음날이었다. 놀이터에서 터를 잡고 놀던 아이들이 나와 함께 다가오는 딸아이를 발견하곤 이름을 부르며 반겼다. 돌아가며 베이비시터를 자청하는 아이들을 보며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는 말을 떠올렸다.
셋째날 딸아이가 졸라 또다시 갔다. 텅빈 놀이터에 잠깐 실망하는데 저쪽에서 여자아이 셋이 달려와 딸아이를 채갔다. 보답하고 싶었다. 강남대 앞 매장에서 직접 사면 9500원밖에 안되는 00치킨이 제격이었다.
“치킨 사줄까?”라는 물음에 아이들은 우물쭈물. 딸아이를 아이들에게 맡겨두고 바람같이 자차를 몰아 치킨 한 마리를 샀다. 그런데 이런, 그새 놀이터는 낯선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치킨은 아이들 사이 분란을 일으킬 게 뻔했다. 고민 끝에 차 안에 치킨을 놔뒀다. 차 안은 금방 고소한 냄새로 가득찼다. 치킨은 식기 전 먹어야 하는데. 급했다. 나는 딸아이와 놀고있던 아이들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다른 애들이 많은데 우리들끼리만 먹으면 미안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아저씨 차에서 먹을래?”
순간, 해맑은 얼굴이 경직됐다. 싫은가? 어쩔 수 없이 치킨을 가져와 낮은 돌담 위에 나란히 앉아 한 두조각씩 먹었다. 이전과 뭔가 달랐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치킨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제서야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복기했다. 선의가 얼마든지 악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 경계하고 있구나. 아이들과 내 사이는 진공상태가 됐다. 한 아이가 영어공부를 하다왔다며 자리를 떴다. 다른 아이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당황한 나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아, 너그럽기 그지없던 딸아이 미래 학교 선배들은 그날 이후 지금껏 놀이터를 찾지 않는다. 이 얄팍한 잡문은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나만의 호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