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신문] 치자治者의 덕목에는 삼계三戒와 삼외三畏가 있는데 논어 계씨편 7문장에서는 경계할 세 가지를 일러 색, 시비, 돈이라 한다. 두려워 할 세 가지는 예기 잡기 하편에 의하면 이렇다.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함을 두려워해야하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을 두려워해야하고, 기억했음에도 실천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명토 박는다. 계씨편의 삼계는 수신의 문제요, 예기편의 삼외는 덕목의 문제이다. 치자는 내적으로는 수신이 되어 있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政治는 문자 그대로 바른 다스림이다. 바를 정正에 칠복攵이 더해져 이루어진 정政은 남을 매질을 해서라도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매로 쳐서 바르게 한 다음 백성을 다스리라는 말이다. 정치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저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해서 백성의 본이 되면 되는 것이다. 계강자가 “어떻게 해야 백성이 따르겠습니까?”하고 물으니 공자는 말한다. “너만 잘하세요. 그러면 백성은 저절로 따릅니다.” 여기서 유명한 숙감부정孰敢不正의 고사가 생겨났다. 물론 정치는 도덕군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 다만 누가 국민을 더 위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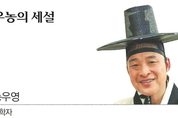
[용인신문] 세례요한의 죽음은 믿음을 떠난 목회자의 현주소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이는 죽음을 쓰는 방향이 달라서다.<人固有一死, 或重于泰山, 或輕于鴻毛, 用之所趨異也> 이를 용지소추중적덕用之所趨重積德이라 하는데 죽음을 쓰는 방향에는 살면서 거듭 쌓아 온 덕이 있어야 죽음 또한 태산보다 무거워진다는 말이다. 용지소추는 사마천의 말이요, 중적덕은 노자의 말이다. 갈릴리 지역과 베뢰아 지역을 다스리는 본명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대왕의 10명의 아들 중 첫째다. 그는 미망인 이혼녀 헤로디아와의 관계로 세례요한의 질타를 받았고, 세례요한은 그 일로 목이 잘려 머리는 쟁반에 들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당시 헤로디아는 삼촌인 헤롯2세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반역죄로 죽자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있는 둘째 삼촌 빌립에게 시집가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고 이혼했다. 이에 헤롯의 입장가로 법률적 잘못은 없음에도 요한은 모세 율법을 들어 가열 차게 책하는 것으로 사역 후반부를 낭비한다. 그로인해 메케루스 감옥에 1년이 넘도록 갇히면서 믿음 또한 바닥을 드러내는

[용인신문] 초나라 소왕昭王때 정치현실이 몹쓸 극에 달하자 스스로 미친척하며 살던 본명이 육통陸通인 광접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자가 초나라 국경에 이르자 그가 탄 수레 옆을 지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중 한 대목은 이렇다. 지난 일을 말해 뭣 하랴(왕자부가간往者不可諫). 오는 것은 그나마 따를 수가 있질 않은가(내자유가추來者猶可追. 논어 미자微子5). 이를 중국 동진시대 사람 시인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다시 풀어낸다. 이미 지나간 잘못을 탓할 수 없음을 깨닫나니(悟已往之不諫) 앞으로의 일은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음을 알았노라(知來者之可追). 이를 조선시대 문인 장유는 ‘갑인 년 섣달그믐 밤의 감회’(甲寅除夕有感)라는 글에서 지난일은 뚝 끊어버리고 앞일만 가지고 다시 풀어낸다. 앞날은 그래도 어찌할 수 있으니(래자상가추來者尙可追) 이제부터 모쪼록 다시 시작하리라(자차수갱시自此須更始장유張維계곡집谿谷集25권). 그렇다. 이미 지난일 묻고 따진들 뭐 어쩌겠는가. 장유가 이글을 쓸 때가 1612년 26세때 김직재金直哉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파직으로 고향인 경기도 안산安山에 은거한지 3년 되던 해 섣달그믐 밤 새해를 다시 시작하자는 다짐으로 쓴 글이다.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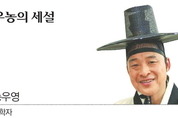
[용인신문] 섭 땅의 백성들이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이웃나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나는 일이 잦아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백성이 줄어드는 탓에 세수가 적게 걷히자 섭 땅의 군주 섭공葉公은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공자가 지나간다고 하여 한달음에 공자를 찾아가 저간의 사정을 말하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 물음이 꼭 백성만을 위한 물음이 아님을 모르지 않는 공자는 한 자락 깔고 답한다.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즐겁게 살게 해 줄 수만 있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밖으로 멀리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떠난 백성들도 저절로 돌아올 것이다.” 섭공은 탁견이라며 공자일행을 후히 대접한다. 관자 목민 편에 정치가 흥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데에 달려 있고, 정치가 망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거스르는 데에 달려 있나니 백성들은 가난을 두려워하고 천하게 사는 것을 싫어한다. 군주 된 자는 이를 살펴서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하며, 나아가 근심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이것이 군주의 일이다. 그러면서 사족을 단다.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군주를 위해 죽을

[용인신문] 윤석열을 임명할 땐 언제고 이젠 윤석열을 잡겠다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법치 국가에서 법을 쥔 자들은 그야말로 갑중에 갑이다. 법을 기준으로 두 개의 깡패가 있다. 법위에 있는 깡패와 법아래 있는 깡패. 세상은 이를 전자는 검찰이요, 후자는 양아치라 불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 법률적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마음속 대통령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이며 번외로 밤의 대통령은 모 언론사 사주 아무개다. 물론 윤석열 이름이 갖는 국민적 평가는 대통령 문재인을 보는 호불호만큼일수도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최순실(개명 최서현) 특검에서 특별검사보에 임명된 윤 검사가 했다는 말 중 하나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말이었다. 이 말에서 읽혀지듯이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정무능력이 없다.” 라고 쐐기를 박아놓고 시작한다. 오로지 범죄만 보고 가겠다는 말이다. 그야말로 애초부터 브레이크를 만들지 않은, 멈춤을 잊은 게 아니라 멈춤이 없는 폭주기관차다. 여기다 검찰총장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병아리 눈물만큼의 책잡힐 일을 보여서는

[용인신문] 시경(詩經) 상서(庠序) 관저에서 말한다. 언자무죄(言者無罪) 문자족계(聞者足戒). 설령 틀린다 해도 말하는 이는 죄가 없나니, 듣는 이가 경계로 삼으면 된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허기가 져서 사는 게 힘들다고 원성이 자자하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응당 정치인이 져야한다. 정치란 승패를 다루는 점에서는 전쟁과 같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정쟁이다.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정쟁이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은 전쟁이다. 그래서 정치는 정쟁은 될 수 있어도 전쟁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전쟁이다. 국민의 눈에 비친 정치인들의 행태는 영락없는 퇴로를 막고 섬멸해야 할 ‘적’ 이라는 점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서로에게 겨눈 총구는 빠르게 도륙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 보다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자신의 배부름과 제 가족 등 따숨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본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란 나라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다. 그 권력에 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파하는 국민은 치료해주고, 배고파하는 국민은 배부르게 먹여주고, 징징대는 상대 당에 대해서는 배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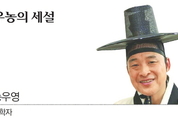
[용인신문] 정치란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정치는 정쟁까지는 할 수 있어도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 나가야 끝나는 곧, 이긴 자가 진자를 죽여야 속이 시원한 전쟁의 시대로 돌아갔다. 지금은 아얏 소리도 못하는 이정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흔히들 탄핵 대통령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는 그런 자였는데 그가 한창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없고 뭐라도 된 양 안하무인격으로 나설 때 이런 말이 뉴스에 떴다. “내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나 우문인지 몰라도 손가락에 장을 지졌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다. 요즘에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느닷없이, 그것도 뜬금없는 죽을 각오로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한다.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산같이 많은 이때에 한가롭게 밥이나 굶겠다니 물론 죽을 각오까지는 할 수 있다. 그보다 더한 각오인들 못하랴마는 문제는 실천이다. 전에 김 아무개의원인가는 뭐가 그리 억울했던지 씨도 안 먹히는 일로 단식투쟁 어쩌고저쩌고 하며, 눈먼 강아지 지푸락 잡아당기듯이 호들갑 떨었다. 혹자가 보기에 그런 모습이 오죽 꼴사나웠으면 툭 쳤다고 한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테러

[용인신문] “신하인 탕이 천자 걸을 추방했고, 신하인 무왕이 천자 주를 토벌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며 제나라 선왕이 물으니 맹자가 “옛 문헌에 그렇게 쓰여는 있지요.” 라고 답한다. 그러자 선왕이 의아해 하며 이렇게 말한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맹자는 군주필부론을 펴는데 인을 해치는 사람을 적賊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殘이라 하는데 잔적한 자를 일개 필부라 말하지요. 일개 필부인 주를 주살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지요.” 양혜왕장구하8문장의 이 기록은 군주라도 군주 노릇 제대로 못하면 필부로 죽어갈 수 있다는 그 옛날 호랑이 담배 물던 시대에도 그 정도는 했다는 말인 셈이다. 불과 몇 해 전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이면에는 국민을 위해 써달라고 부여한 권리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인 것이다. 임금과 신하 위 아래가 각각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맹자는 명토박는다. 어떤 정치인이 있었다. 맹자가 “지역구를 돌봐야하는데 지역구는 버려둔 채 중앙 정치판에 가서

[용인신문]촛불 광장 정치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돈 지금의 시점에서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서울대학교 교수이던 조국이라는 인물을 등용하면서부터이다. 훤칠한 키의 서울대 법대 출신에, 서울대 법학교수의 신분인 그는 기성세대에 대한 약자의 편에서 그야말로 약자가 듣고 싶어 하는 대목만 때로는 칼럼으로, 때로는 강연장에서의 현란한 수식어로 아픈 청춘의 상처들을 시원하게 도려내주었다. 물론 그때 했던 그의 말과 행동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조적조, 즉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신조어까지 낳게 된다. 어쨌거나 그는 지식인이 갖기 쉽지 않은 행보로 인해 수감까지 되는데 속칭 사노맹 사건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저쪽 반대편에서 보면 억 소리 하고도 남을, 온몸으로 실천해가는 그의 삶은 그가 주는 중량감이 결코 녹녹치 않았음을 반증해준다. 그런 그에게도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으니 전하는 말에 따르면 학내에서 영문과에 재학 중인 정경심 교수를 만나고 부터였고, 여자 쪽에서 더 적극적이었다고 하니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으랴. 조국의 첫사랑은 그렇게 결실을 맺는다. 남자의 삶에서 첫사랑

[용인신문]계씨 집안의 7대 영주였던 계환자의 아들 계강자는 정치 입문 10년이 흐른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정치 동지인 60세에 이른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다. 공자는 “정치란 바름이다<政者 正也>. 네가 바름正으로 솔선한다면<자솔이정子帥以正. 솔帥은 ‘장수 수’로 읽지만 때론 ‘본보기 솔’로 읽는다.>누가 감히 바르게 행하지 않으랴<숙감부정孰敢不正. 논어 안연편顔淵篇17>”고 말했다. 계강자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자 공자는 사족을 단다. “네가 바르면 백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고, 네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들은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자왈子曰 기신정其身正 불령이행不令而行 기신부정其身不正 수령부종雖令不從논어子路6>. 그러면서 천하에 위衛나라 영공靈公처럼 쓰레기 같은 자가 또 있으랴”라며 분개하니<논어 헌문편> 계강자가 대꾸하기를 “그럼에도 위 영공은 임금 자리는 잘도 유지하지 않습니까?”하니 공자가 말한다. “중숙어는 외교를 잘해 무역이 흥하고, 축타는 종묘를 제대로 이끌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왕손가는 군대를 잘 다스려 국가가 평안한데 임금 자리를 누

[용인신문]예수님이 목수였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테크톤(tekton)은 실제로는 돌을 다루는 석수에 가까운 단어다. 이스라엘 산에는 나무가 없다. 당시 건축물도 대부분 돌로 된 것을 미루어볼 때 예수의 공생 이전 직업은 나무를 다루기는 하지만 나무만 다루는 전문적인 목수가 아니라 나무와 돌을 모두 다루는 석공이었다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추측하건데 돌을 다루는 예수의 삶은 꽤나 힘겨웠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그래서 더욱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동감과 공감을 이끌어 냈는지도 모른다. 무거운 삶에 지친 배고프고 가난한 저들은 그런 예수의 말에 마음을 열고 따르기에 이른다. 어떤 이는 이런 예수를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자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밤중에 끌고가 심문을 한다. 주범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현 대제사장이며, 산헤드린 공회의장 가야바이다. 산헤드린 공회 법규에는 해가 뜨기 전에는 공회를 소집할 수도 없으며, 어떤 종교적인 죄인도 밤중에 심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밤

[용인신문]인정하기 싫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늘 알 수 없는 슬픔이 존재한다. 오죽하면 가난한 사람은 여름도 춥다고들 말하지 않는가. 누구에게나 삶이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먼 길 가는 나그네가 길바닥에 발자국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는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힘겹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몸만 맡겨두면 되겠지만 저들에게 흘러가는 그것이 내게도 있었다면 우린 절대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엄마가 답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숟가락이 존재한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그것이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 그냥 살기만 하면 되지만 누구는 살다 못해 견디고 버텨 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금수저들이 서로 잘났다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중에도 흙수저들은 먹고사느라 슬퍼할 틈도 없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하고 자공이 묻자, 공자가 “당연히 있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을 미워하며, 용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