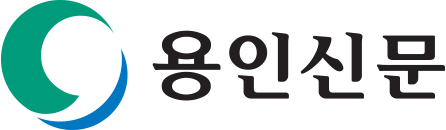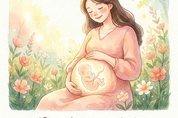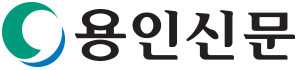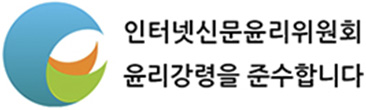용인신문 | 드라마에서라도 부부싸움 장면은 보지 말자. 특히 남편의 윽박지름이나 폭언과 폭행은 더더욱 그러하다. 드라마니까 연출이니까 쉽게 넘길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임신부의 감정은 바람 부는 날의 바다 같다. 호르몬의 파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남편의 스트레스가 덧씌워지면 순식간에 폭풍이 된다. 임신 중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유난히 크게 다가온다. “괜찮아?”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너무 예민해졌어”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진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임신 중 가장 많이 싸웠다”고 회상한다. 문제는 그 감정의 파장이 배 속까지 닿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편의 행동과 말이.
의학적으로 임신부의 뇌는 배우자의 감정에 평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감 회로가 확장되면서 상대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까지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부부의 뇌가 일종의 ‘공용 주파수’로 연결되는 셈이다. 남편이 불안하면 산모의 자율신경계도 긴장하고, 남편이 지쳐 있으면 산모의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 수치가 함께 높아진다.
하버드대 연구는 부부 갈등이 잦은 가정의 태아가 심박동 변동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이는 스트레스 적응력, 즉 아이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수치다. 쉽게 말해 부모의 싸움이 잦을수록, 아이는 세상을 ‘긴장 속에서 배우는 법’을 먼저 익히게 된다.
물론 말다툼 한 번으로 아이가 상처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싸움보다 더 위험한 건 ‘침묵’이다. 감정의 벽이 쌓이고 무관심이 일상이 되면, 산모는 ‘혼자다’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받아들인다. 외로움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그 우울은 호르몬을 통해 태아의 정서 회로를 자극한다. 결국 태교는 음악도 음식도 아닌, 부부의 감정 온도에서 시작된다.
권위적인 아버지보다 다정한 아버지의 자녀가 더 안정적이라는 말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 출발선은 임신기다. 임신부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남편의 태도는 산모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아이의 심박을 고르게 만든다. 반대로 “좀 참아”, “성격 이상하네” 같은 말은 작은 폭탄이 된다. 그 순간 산모의 코르티솔이 급상승하고, 아이의 심장은 조금 더 빨라진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말한다. “임신 중 남편은 정서적 공동체의 중심이다.” 남편이 임신 과정을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산모의 불안은 현저히 줄어든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조산률과 저체중 출산 위험도 줄어든다. 그 효과는 생각보다 직접적이다.
아빠의 무뚝뚝함이 유전된 게 아니라, 배 속에서부터 학습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임신 중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가 기억하는 생리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과 목소리로 세상의 온도를 배운다.
임신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통과하는 터널이다. 그 터널을 밝히는 건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니다. 다정한 말, 함께 걷는 산책, 손끝의 온기 같은 작은 일들이다. 싸움이 문제라기보다, 싸움 후에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손끝의 온도를 아이는 기억한다. 부부싸움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다. 세 사람의 일인 것이다. 그중 한 사람은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