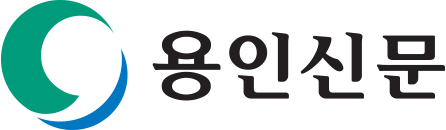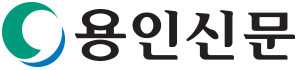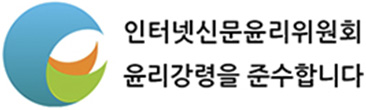밑바닥에 살아도 하늘은 보인다.
동한말의 도사 좌원방(左元放) 좌자(左慈)는 여강인(人)으로 유학 오경에 통달했다. 좌원방은 천주산(天株山) 신인(神人) 갈선공(葛仙公)<갈홍의 종조(從祖)>에게 태청단경(太淸丹經) 구정단경(九鼎丹經) 금액단경(金液丹經)을 전수 받은 뒤 도가 깊어져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자 따르는 무리가 크다.
조조는 후일 민란을 염려해 죽일 계획까지 세우나 실패. 첩첩 산중에 은거하며 제자를 길렀는데 그중 하나가 갈홍의 스승 정은(鄭隱)이다. 갈홍(葛洪)은 동진(東晉)때 사람으로 남경(南京)근처 단양(丹陽)생으로 일생에 세 명의 스승을 뒀는데 한명은 사숙이고 정은(鄭隱)과 동진(東晋) 관리 포정(鮑靚)이다.
후일 포정의 딸 포고(鮑姑)와 결혼한다. 가난했던 갈홍은 밥벌이로 사느라 성년이 되어 글을 깨우쳤는데 노자의 도덕경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며 첫 스승 사숙(私淑)이 된 셈이다. 갈홍은 도덕경 19장. ‘있는 그대로 순박한 것을 껴안는다.’는 현소포박(見素抱樸)에서 포박(抱樸)을 따서 아호를 삼고 책 제목도 ‘포박자’ 라 했다. 도교에서는 포박자(抱樸子). 황정경(黃庭經).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3대 경전으로 꼽는다.
갈홍은 도덕경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20장 절학무우(絶學无憂)에서 깨달음이 와서 책장을 덮는다. 글자 그대로 풀면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인데 갈홍은 깜냥껏 살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모두가 한 줄로 서서 같은 길로만 가야 그나마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알파시대에 절학 무우는 오메가를 꿈꿀 수 있는 틀림이 아닌 다름일 것이다. 절학무우란 말이 책장을 덮을 정도의 그런 말은 아닌데 갈홍이 절학무우가 가슴에 닿은 이유는 뭘까. 그건 밑바닥에만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속칭 먹물들이 뱉어내는 말의 상처일 것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억편(抑篇)에 백옥(白玉)으로 만든 규(圭)의 흠은 갈아 없앨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의 흠은 다스릴 수 없다.<白圭之玷 尙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 이 시를 남용이 하루 세 번씩 반복해서 외우자 공자는 이를 가상히 여겨 형 맹피의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낸다. <南容三復白圭 孔子以其兄之子 妻之 論語先進5文章>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면 그걸 수치로 여기고(君子 恥其言而過其行),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아무리 빨라도 혀에는 못 미친다. 사부급설(駟不及舌)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는 말한다. 예문의로(禮門義路). 무릇 의는 길이요, 예는 문이다(夫義路也 禮門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