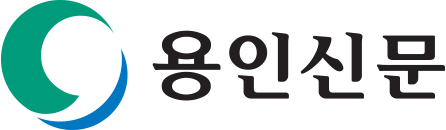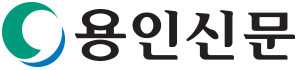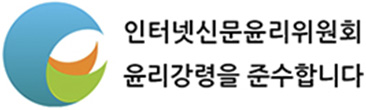간신은 당대에 번영을 남긴다는데.
고전의 가르침은 시시비비(是是非非)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배워서 익힌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계<金長生·1548-1631> 왈, 예(禮)로써 가르치면 상식적인 백성이 되고 법(法)으로 가르치면 상식적이지 않은 백성이 된다. 국민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최고의 봉사자 대통령을 돕는 수석이나 행정관 등은 정년이 보장 되지 않는 일개 임명직 공무원으로 보기에 따라서 간신으로 비칠 수도 있고 충신으로 비칠 수도 있다.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는 본래 그 성격상 대통령보다 앞서서 드러내는 자리는 아니다. 그저 묵묵히 대통령에게 시시비비를 말하면 될 뿐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다는데 방점이 찍힌다는 거다. 다는 아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망칠 때가있다.
간신은 당대에 번영을 남기고 충신은 후대에 기억된다. 문제는 후대에 기억되는 충신은 많지만 당대 번영을 남긴 간신은 많지 않다는데 있다. 조선시대에 임금을 모시는 선비들은 일정시간 시골 훈장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인문학인 서당 교육을 받는다. 시골 훈장이 알면 뭘 얼마나 알랴 마는 그들이 그런 훈장에게 논어맹자 교육을 받는 이유는 훈장보다 못나서 그럼이 아니다.
훈장은 산천 방방곡곡에 글방을 차려 놓고 그들 자녀를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밑바닥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봐온 사람들이다. 더욱이 훈장은 부자가 될 일 없으니 관에 잘 보일일도 없고 농사를 안 지으니 농부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 그 무엇에도 세발장대 가지랭이 걸림새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훈장은 강직하되 사욕(私慾)이 없고 사욕이 없으니 사욕(邪慾)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듣기 불편한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다. 훈장의 첫 가르침은 종명시(終命詩)다. 종명시는 부(賦)형식을 빌어 칠언배율로 짓는데 첫 행 ‘살아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로 시작해 끝행 ‘성현의 책을 읽어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난 일이 없었다’로 끝난다.
첫 가르침이 종명시인 것은 왤까. 임금을 지근거리에 모시면서 임금 빽 믿고 나대지 말란 경고다. 다수의 열심히 사는 국민을 늘 괴롭히는 것은 뒷산 호랑이가 아니다. 돼먹지 못한 것들이 완장차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