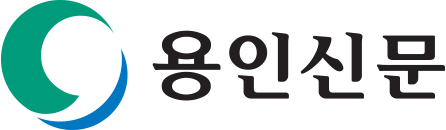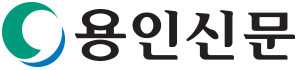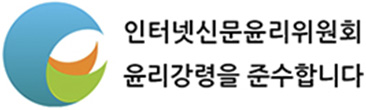삼복 그리고 보신탕
헌(獻)을 파자하면 솥 권(鬳)+개견(犬)이다. 권(鬳)은 범호(虍)+솥력(鬲)이다. 호랑이 무늬(虍)를 새겨 넣은 세 발 달린 솥(鬲)<鼎>에 개(犬)를 삶아서 올린다. 예기고본(禮記古本)곡례하(曲禮下)에 무릇 종묘 제사 예는 개고기국을 올린다<凡祭宗廟之禮 犬曰羹獻>.
헌(獻)은 제사용어로 개를 올릴 때 사용한 한자이다. 이를 맡은 자를 삼헌관(三獻官)으로 제사에 술 첫잔을 따르는 이를 초헌관(初獻官)정1품이 맡고, 아헌관(亞獻官)은 정3품 당상관으로 둘째 잔을 따르고, 종헌관(終獻官)은 정 3품으로 셋째 잔을 따른다.
문제는 갱헌(犬曰羹獻)이다. 허신설문(許愼說文解字)은 갱헌(羹獻)을 크고 살찐 개고기로 갱(羹)은 국인데 갱헌(羹獻)은 개로 끓인 국으로 이때 국은 비도갱헌(非刀羹獻)이라고 칼 닿지 않은 개고기 국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요리 법은 1차 삶은 고기를 건져 찬물에 식힌 뒤 베로 싸서 돌로 반나절 정도 눌렸다가 적당히 식으면 손으로 아주 가늘게 결대로 찢어 국을 끓여 젓가락으로 저어보면 젓가락에 솜사탕(원문엔 실처럼)처럼 걸린다. 정조 화성 행차 때 혜경궁 홍 씨에게 드렸다는 국이다. 당나라 맹선(孟詵)이 쓴 식료본초(食療本草)에 맛의 순서로는 누렁이는 일황(一黃), 검둥이는 이흑(二黑), 얼룩이는 삼화(三花), 흰둥이는 사백(四白)이다.
참고로 공자는 개를 먹지 않는다. 중니의 기르던 개가 죽었다 자공을 시켜서 묻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낡아 헤진 휘장을 버리지 않는 것은 개를 묻기 위함이라고 한다. 나는(공자) 가난하여 이를 덮어줄 것이 없으니 그 시체를 묻을 때 거적자릴 충분히 써서 그 머리가 흙속에 빠지지 않게 하라(仲尼之畜狗死 使子貢埋之曰 吾聞之也 敝帷不棄爲埋馬也 敝蓋不棄爲埋狗也 丘也貧無蓋 於其窆也亦予之席 毋使其首陷焉<禮記檀弓下卷四).
개고기는 불화(火)이고, 삼복더위의 복(伏)은 금(金)이다. 화가 금을 이긴다. 화극금(火克金) 개고기 먹고 더위를 이긴다. 삼복에는 마를 넣은 닭과 개고기를 먹는다(食鷄麻與犬).
속설에 개고기 먹고 속이 거북하면 살구 씨를 갈아 먹으면 좋다. 살구는 살구(殺狗)다. 보신탕의 시작은 아마도 진(秦) 덕공 2년 기원전 675년 복(伏)날을 정해 더위를 견뎠다(以狗禦蠱史記秦本紀). 좌우간 개고기에 관한 옛글의 공통적 단어는 딱 두 개로 압축된다. 하초(下焦)와 양기(陽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