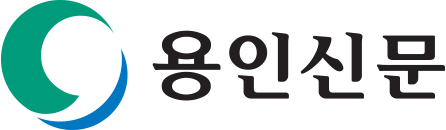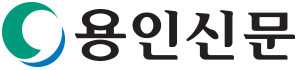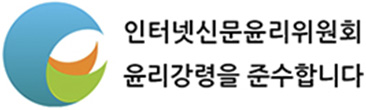두보 곡강곡으로 곡을 한다.
예로부터 책은 삼독(三讀)이라 하여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손으로 읽는다. 여기서 기본은 소리에 음률이다. 옛 선비는 글은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독서란 낱말의 뜻도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서당가거든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읽고 오너라 고 했다. 서당은 종일 책 읽는 소리가 낭랑했다. 읽다보면 자기만의 째가 나온다. 이 째는 송서로 율창으로 불려진다. 물론 송서율창이란 것이 석북 신광수의 관상융마처럼 전문적인 무형문화재 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을 읽는 째는 또 다른 맛이 있다.
여름 방학에도 서울에서 국문학과 학생들이라며 송서(宋書)와 당시(唐詩) 몇 수(首) 들고 와 시창을 요한다. 그 중 하나가 곡강에서 슬퍼 한다는 두보(杜甫)의 애강두(哀江頭)다. 少陵野老呑聲哭(소릉야로탄성곡)하며, 春日潛行曲江曲(춘일잠행)<에행>(곡강곡)<이라>江頭宮殿鎖千門(강두궁전쇄천문)<이요>……< >는 음의 추임새임> 애강두는 서인 노론 시회(詩會)에서 자주 읊어진 칠언시인데 문곡 김수항 사사이후로는 사라진다.
우암은 평생에 600편의 묘갈명을 지었는데 그중 백미가 문곡의 묘갈명이라 한다. 문곡이 우암보다 간발의 차로 먼저 죽는데 유언하길 만약에 우암이 나보다 늦게 돌아가신다면 나의 묘문은 반드시 우암의 친필이어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묘비명을 미리 다 적어와 수결만 해 달라하니 당시는 우암이 정읍에서 사약을 받는 숙종 15년 1689년6월7일이다. 우암은 문곡 같은 훌륭한 선비의 묘비명을 함부로 지으리오 하며 한수재에게 눈짓으로 붓을 한번 찍을 만큼만 먹을 갈라 한다. 먹이 다 갈려지는 동안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곡강곡(曲江曲)으로 곡(哭)을 한다. <대략 걸리는 시간이 요즘으로 치면 2~3분정도> 欲往城南望城北(욕왕성남망성북)<이라>……그렇게 애강두가 끝나자 우암은 붓을 들고 一墨揮之一筆性(일묵휘지일필성)<붓에 먹을 단 한 번만 찍어 다 쓰는 글>으로 문곡 김수항의 묘갈명을 쓴다. 이일 후 애강두는 시회(詩會)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2016년 까맣게 잊고 지냈던 두보의 애강두를 뜻하지 않은 기회에 읊어보았다. 선비의 죽음에는 필부의 죽음에서 보는 눈물의 곡이 아닌 그 후학이 곡강곡<애강두>으로 곡(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