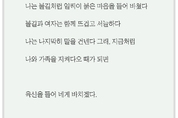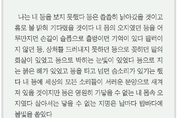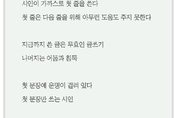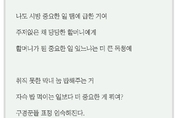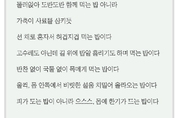주먹 이시가와 다쿠보쿠 나보다 부자인 친구에게 동정 받아서 혹은 나보다 강한 친구에게 놀림 당해서 울컥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을 때 화나지 않는 또 하나의 마음이 죄인처럼 공손히 그 성난 마음 한편 구석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덥지 못함. 아아, 미덥지 못함. 하는 짓이 곤란한 주먹을 가지고 너는 누구를 칠 것인가 친구인가, 너 자신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죄 없는 옆의 기둥인가 산다는 게, 살아가는 게 죄 짓는 일의 연속이다. 둥근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보내고 처음 이 세상과 조우할 때, 인간이 손에 쥔 것은 두 주먹밖에 없다. 아프락사스, 부리 대신 주먹으로 한 세계를 깨부수고 다른 세계를 만난 것이다. 인간은 두 주먹 불끈 쥐고 험난한 가시밭길 세상을 헤쳐 나간다. 배고플 때 주먹을 깨물었다는 말, 그건 살아남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리라. 그런데 세상은 주먹만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다. 요즘엔 돈이 주먹이고 권력이 주먹이고 학벌이 주먹이다. 주먹이 변변치 못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분노의 카운터블로를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여, 당신의 적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적은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의 연약한 이웃이 아니다.
친애하는 사물들 이현승 아파서 약 먹고 약 먹어서 아팠던 아버지는 주삿바늘을 꽂고 소변주머니를 단 채 차가워졌는데 따뜻한 피와 살과 영혼으로 지어진 몸은 불타 재가 되어 날고 허공으로 스몄는데 아버지의 구두를 신으면 아버지가 된 것 같고 집 어귀며 책상이며 손닿던 곳은 아버지의 손 같고 구두며 옷가지며 몸에 지니던 것들은 아버지 같고 내 눈물마저도 아버지의 것인 것 같다 우리는 생긴 것도 기질도 입맛도 닮았는데 정반대의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본다 포옹하는 사람처럼 서로의 뒤편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처럼 무표정하게 서로를 비껴가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대개 엄마보다 먼저 죽고, 이 땅에서 나고 자라 나이 사십을 넘긴 자식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안아본 기억이 없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돈은 집밖에 있고, 아버지는 언제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없었다. 모든 것을 물려받았는데, 내 몸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 내가 지금 나의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를 안고 싶어서일지 모른다.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고, 안을 수 없어서 더욱 서글퍼지는 아버지. 나는 나의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지금의 나를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절
평창 민박 이용임 고요한 여자는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고 새소리를 잡아먹으며 눈이 내리고 숲 속에는 누가 사나 검은 발톱 바람 흘러내리는 시간은 시계에 잊어버리는 표정은 벽지에 고독한 여자는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고 윤곽을 지우며 고양이의 눈은 내리고 아내는, 처음엔 호텔 같은 여자였다. 깨끗하고 세련됐으며 엄청 비싸게 행동했다. 그랬던 호텔이 온갖 풍상 겪고 나니, 장식은 떨어져 나가고 페인트칠은 벗겨졌으며 여기저기 아프다고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가끔 낡음과 익숙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내를 낡게 만든 나의 잘못인 것이 분명하다. 낡음과 늙음은 분명 차이가 있다. 누가 저 여자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워 낡아가게 했는가. 누가 저 여자의 자궁을 빌려 오늘의 기쁨인 아이를 만들었는가. 그 상큼했던 미소마저 무뎌질 대로 무뎌진 여자는 이제 시골 민박집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다. 아침마다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라디오를 틀어 놓고 빵을 자르며, 어슴푸레한 식탁에 앉아 졸고 있는 아이와 술이 덜 깬 남편을 일으켜 세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고독은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곧 그녀에게도 막막한 쓸쓸함으로 나를 버리고 너도 버리고 그저 온통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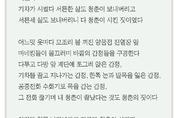

박후기 시인이 울림을 주는 시 한편을 연재하기 시작한지 벌써 100회째다. 주간 신문에서 100회면 2년이다. 원고를 써놓고도 컴퓨터 에러로 딱 한번 펑크가 났다. 가난한 시인은 발행인과의 친분 때문에 원고료도 없이, 그렇지만 그 어떤 재벌신문들의 시 코너보다도 울림이 강했고, 뜨거웠다. 시 나부랭이를 쓴다며 동료애를 구걸한 발행인 김씨의 이왕 내친김에 1년만 더라는 부탁을 차마 거부하지 못한 박 시인이 또 다시 1년 연장을 약속했다. 어쩌랴. 신문은 가난해도 울림이 있는 당신의 따뜻한 시선과 심상에빠진 독자들이 많은 걸. 편집자 주 ▲ 박후기 시인. 울림이 없다면 사랑도 없는 거야 울림이란 메아리 혹은 반향인 것을 내 글이 침묵하는 당신의 저녁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그렇게 낮은 반울림이었으면 散文詩(1) 신동엽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덱거 럿셀 헤밍웨이 장자(莊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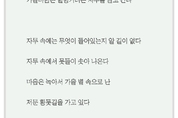
울림을 주는 시 한 편 - 99 고목 한 그루 김수복 가을바람 속에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다 나는 헐렁거리는 자루다 욕망이 자꾸 불거져 튀어나오고 싶어 하지만 가을바람은 헐렁거리는 자루를 끌고 간다 자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다 자루 속에서 못들이 솟아 나온다 마음은 녹아서 가을 볕 속으로 난 저문 황톳길을 가고 있다 늙으면 속부터 썩어 가느니, 겨우 매달린 단풍 몇 잎으로 제 아무리 비단을 두른다한들 헐렁거리는 자루일 수밖에. 늙고 삭아 고목이 된 것이 죄는 아닐 것이나, 텅 빈 구멍마다 시멘트 쳐 바른다한들 제 살붙이와 같을 것인가.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는 날들이 다가오거늘, 죽음이 코앞인데도 욕심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날 아득한 어린 생목(生木)의 앞길을 짓이기며 굴러 내려와 물길을 막고 있는 썩은 고목이여, 욕망의 못된 가지여! 너는 어찌 대못이 되어 타인의 살(肉)을 찌르고 숲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가. 무덤이 둥근 이유를 네가 알면 좋으련만, 너의 욕심은 무덤 속까지 손을 뻗치고 있구나. 박후기 시인 hoogiwoog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