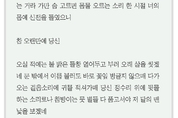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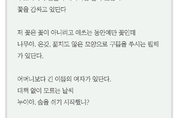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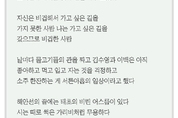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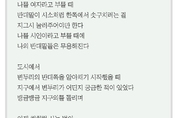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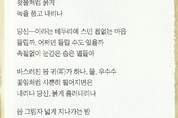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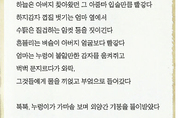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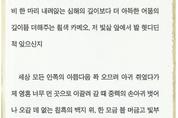
폭염 박성현 아버지가 대청에 앉자 폭염이 쏟아졌다. 족제비가 우는 소리였다. 아버지는 맑은 바람에 숲이 흔들리면서 서걱서걱 비벼대는 소리라 말했다. 부엌에서 어머니와 멸치칼국수가 함께 풀어졌다. 땀을 말리며 점심을 먹는다. 아버지의 눈을 훔쳐본다. 여자의 눈을 쳐다보면 눈이 뽑힌다는 아랍의 무서운 풍습을 말한다. 석류가 터질 때 아버지는 다시 아랍으로 갔다. 그리고 어머니는 빗장을 단단히 채우고 방을 나오지 않았다. 세밑까지 어머니는 화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기다리면 착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내게는 마음이 없고, 문도 없었던 겨울이었다. 아무 말 없이, 소처럼 묵묵히 밥만 먹던 시간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제 살(肉)을 베어 먹이던 어두컴컴한 시절이었으리라. 그리하여 어떻게든 살아지던 시절. 중동(中東)에 보내진 아버지들은 사막 위에서 길을 잃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돌아온 아버지가 가끔은 침묵의 밥상을 뒤집기도 하던 폭염의 시절이 있었다.

꽃의 탄생 윤의섭 불면이란 밤새 벽을 쌓는 일이다 감금, 꺼지지 않는 가로등처럼 뜬 눈으로 견디는 밤과 새벽 사이의 생매장 길 잃은 바람이 어제의 그 바람이 같은 자리를 배회하고 고양이 울음은 있는 힘을 다해 어둠을 찢는다 이 터널은 출구가 없다 어떤 기다림은 질병이다 간절한 소식은 끝내 오지 않거나 이미 왔다 가버리는 것 그러니 너는 얼마나 아름답단 말인가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서야 겨우 잠이 든다 어떤 묘혈은 땅 속을 흘러 다닌다는데 머리맡에 꽃향기가 묻어 있다 첫 매화가 피었다고 한다 꽃 피는 시절이다. 기다리지 않아도 너는 온다. 와서, 한 시절 웃고 떠들다 흔적도 없이 돌아가는 게 꽃의 생이다. 사람들아,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뭐 좋은 꼴 보겠다고, 모래알만도 못한 것들이 수만 년 정기 서린 바위를 뚫고 쪼개고 그 난리들인가.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는 꽃봉오리의 심정으로 살아갈 일이다. 조금은 겸손하게, 또 조금은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생을 보낼 일이다. 어느 날 와락, 하고 열리는가 싶더니 벌써 지는가? 아, 꽃 같은 게 인생이다. 아무렴, 꽃 같은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