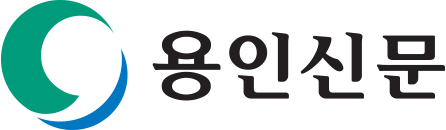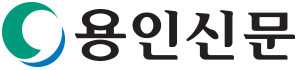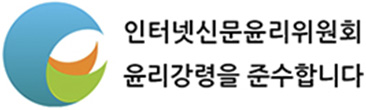용인은 한말 순국열사를 비롯해 무장투쟁의 맹활약을 펼친 의병, 애국계몽활동을 펼친 언론인, 만주 신민부를 주도한 김혁장군 등 수많은 항일투사를 낳았다.
을사늑약 강제 체결후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 선생, 임시정부에서 활약하고 만주지역에서 활동, 국내에 돌아와서 시대일보 기자로 활동하는 등 항일 운동을 펼친 오의선 선생을 비롯해 용인의 레지스탕스(Resistance:침략자에 대한 저항 운동을 칭함)로 일컬어지는 의병장 오인수, 만주를 누빈 맹장인 아들 오광선 장군, 용인이 낳은 여성 광복군인 손녀 오희영과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정보 수집과 초모공작에 참여했던 오희옥 등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 그리고 고종 강제퇴위를 계기로 관직을 버리고 항일투쟁에 나선 임경재 선생,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 승리에도 큰 공을 세운 김혁 장군 등..
이 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할 용인출신의 또 하나의 큰 별, 여준(呂準) 선생(1862∼1932)이 있다. 선생은 1862년(철종 13년) 죽산군 원삼면(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황무지 개척권 반대 운동과 을사늑약 강제체결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 호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 선생은 애국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계몽의 필요성을 깨닫고 국외 망명을 계획했다.
1906년, 간도 연길현 용정촌에 서전서숙을 세웠고 1908년 용인 원삼면 죽릉리에서 삼악학교를 세워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0년 선생은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로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을 위해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했으며 신흥학교 유지회를 구성, 독립군 양성을 위한 민족교육에 매진했다.
선생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산리전투는 물론, 독립군, 광복군의 핵심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선생은 1917년경 길림으로 옮겨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9년 김좌진 등 38인과 함께‘대한독립선언서’발표, 군자금 모금 활동, 상해 임시정부 산하 군정부인‘서로군정서' 부독판으로 항일투쟁 등을 전개했다.
1930년 7월 북만주 위하현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에서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도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1932년 만주사변 와중에 서거하기 까지 일생을 독립군 양성과 항일투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의로운 행적은 1968년에 가서야 정부에서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선생은 한말 자강개혁운동 차원에서의 교육운동과 국권 피탈 후 만주 서간도의 독립운동사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으며 그의 업적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한 여준 선생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세계적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쇠망한다'고 갈파했다. 그리고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라고 했다. 우리는 과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실천하고 있는가?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가?
자강불식(自强不息)!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독립운동 정신은 계승되어야 한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가슴에 모두 손을 얹고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하고 선조들이 피맺힌 한을 간직하면서도 이루고자 한 그 장엄하고 숭고한 신념을 민족정신으로 영원히 계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