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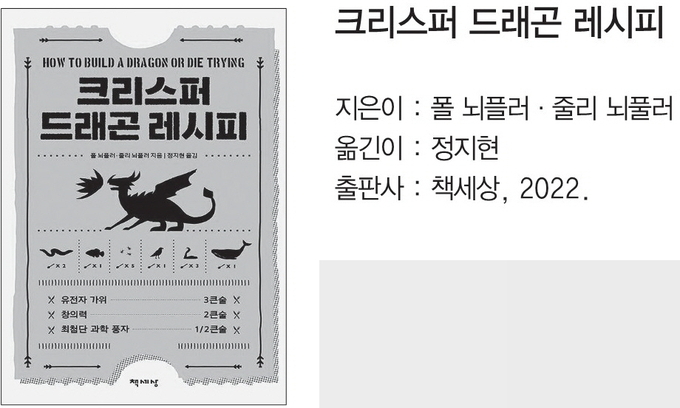
[용인신문] 크리스퍼(CRISPR)는 세균의 유전체에서 발견되는 염기서열을 뜻하는 말이니 ‘크리스퍼 드래곤 레시피’라는 제목은 유전자를 이용한 용을 만드는 방법 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용을 만들겠다니 이런 이상한 선언이 어디 있을까?
용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흥미롭다. 필자는 용과 신체 특징이 인접한 동물들의 유전체를 탐구한다. 이야기 속의 용은 계략을 쓰니까 머리도 좋아야 한다. 그러니 뇌에 관한 연구는 필수다. 불을 뿜기 위해 화학반응을 연구한다. 무거운 용이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생물의 신체 구조를 해박하게 알아야 하며, 항공 분야의 지식도 동원된다. 물론 실험 중에 용이 불을 뿜어서 언제든 목숨을 잃을 각오도 필요하다. 세계 역사에서 용의 등장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신화와 문화를 아우른다. 물론 한국의 용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용이 나와서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러나 저자가 미국 사람이고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흠은 눈감아 줘도 될 법 하다.(책 날개에 저자를 2013년 줄기세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되었다고 소개한다.)
오래전 토머스 트웨이츠의 <염소가 된 인간>이라는 책이 이그노벨상을 탄 바 있다. 인간인데 염소가 되겠다거나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 용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과학자는 인간이 호기심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하지만 잊지 말자. 괴물을 만든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친구와 가족을 잃었다. 그러니 실험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뭐든 오랜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