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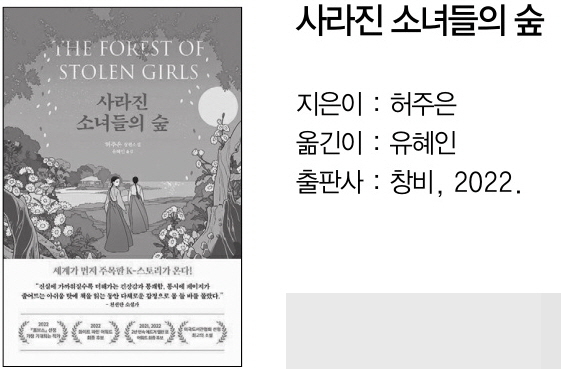
[용인신문] 어떤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원칙보다는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입장은 늘 부딪힌다. 도덕 교과서와 현실의 차이라고나 할까? 교사와 엄마의 입장이 그렇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그렇다. 『사라진 소녀들의 숲』에 등장하는 환이가 원칙파라면 매월은 유연한 현장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언니 환이는 원칙이 지도와 같아서 길을 잃지 않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동생 매월은 언니의 해결방식은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만드니 현장에서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길은 어디에 있을까.
소설은 환이의 제주행으로 시작된다. 제주의 소녀들은 왜 사라졌을까? 그것도 열세 명이나. 소녀들은 숲에서 사라졌고, 민환이의 아버지 역시 그곳에서 소식이 끊겼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맞는 걸까? 종사관이었던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쫓다가 사라진 걸까? 어째서 동생 매월이는 제주에서 5년 동안 무당과 살아야 했을까?’ 환이와 매월이가 찾아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소개되는 제주의 풍경에 빠져 가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이주 한국인이 쓴 한국이야기라는 특이한 면도 있다.
작품을 읽다보면 결국 매월이의 방식도 환이의 방식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운명이 우리에게 선사한 역할은 어느 한 길 만으로 생을 살아낼 수 없게 만든다. 어떤 이는 원칙을 고수하다 죽음에 이르고, 어떤 이는 원칙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 그러나 환이와 매월이가 만들어낸 통합은 뒤틀린 운명과 원칙을 바로잡는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우리도 뭔가 통합이나 협치의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